
파사주 구조와 형태를 볼 수 있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치체크 파사지Çiçek Pasajı’.
미국의 예술가 바버라 크루거의 도발적인 패러디 문구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클리셰로 느껴질 만큼 오늘날 소비는 단순한 구매 행위를 넘어 소비자 개인의 정체성과 라이프스타일을 확립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커머스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의 발달에 힘입어 가속화되고 있다. 바야흐로 대중의 욕망을 추구하던 시대에서 나만의 욕망을 커스텀하는 시대로의 전환이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정교하게 개인화된 소비를 가능케 하는 스마트폰의 패널은 오감을 지닌 소비자를 전적으로 만족시키진 못한다. 문화 심리학자 김정운은 저서 <창조적 시선>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종교적 의례와 같은 의미 구성 행위를 갈구한다고 기술한다. 이 지점에서 산업사회의 자본주의가 전통사회의 종교를 대체했음을 간파한 발터 벤야민의 통찰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는 자신이 쓴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19세기 파리의 파사주passage(아케이드arcade)에서 이뤄지는 쇼핑 이면에 숨겨진 소비의 종교적 의식에 주목했다. 사람들은 이 의식에 열광했다. 그리고 건축 기술은 이것을 당대의 소비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진화시켜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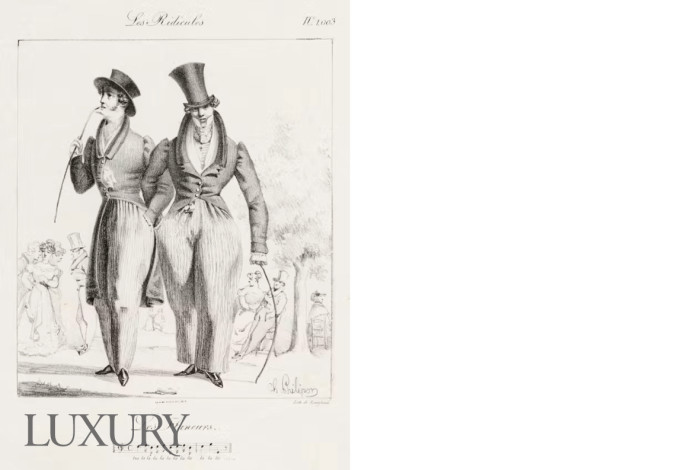
‘파사주 슈아죌’은
파리의 수많은 도시 산책자를 양산했다.
철과 유리로 구현한 자본주의의 성당, 파사주
19세기 초 파리의 뒷골목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만남의 공간이었다. 당시의 프랑스 건축가들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위치하던 뒷골목의 상부를 유리 천장으로 덮어 파사주라는 건축 형식을 만들었다. 바깥의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며 항상 자연광으로 충만한 이 파사주는 기존의 어두컴컴한 실내 공간과는 다른 경험을 안겨주었다. 파리 2구에 있는 ‘파사주 슈아죌Passage Choiseul’은 파리의 여러 파사주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건축가 프랑수아 마주아Francois Mazois가 설계한 파사주 슈아죌은 슈아죌 거리의 연장선으로 두 열의 신고전주의 스타일 건물들 위에 당시로선 첨단 기술이던 아치 형태의 철제 구조 유리 천장을 덮은 190m 길이의 건축물이다. 발터 벤야민은 파사주 슈아죌이 두 가지의 개념, 즉 산책flânerie과 환상phantasmagoria을 통해 자본주의의 제의가 진행되는 장소임을 발견했고 파사주 건축과 성당 사이의 구성적 유사성에 주목했다. 파사주 슈아죌은 만약 성당이었다면 응당 있어야 할 복도 뒤편에 나열된 스테인드글라스 대신 화려한 인공조명 아래 진열된 각양각색의 상품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적 이미지를 상점 입면에 투영해 사람들을 매혹했다. 게다가 파사주를 따라 상점뿐 아니라 극장,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서점까지 입점함으로써 이 도시 뒤편의 거리는 생업 공간을 넘어 구경 자체가 즐거운 산책 무대가 되었다. 밤낮없이 자본주의의 환상적인 향연이 펼쳐지는 이 건축물은 수많은 파리의 도시 산책자(플라뇌르flâneur)를 양산했다. 본격적인 근대식 백화점인 ‘르 봉 마르셰Le Bon Marché’가 등장하는 19세기 중반까지 파사주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건물들 위에 아치 형태의 철제 구조 유리 천장을 덮은 파사주 슈아죌.
철 구조의 발달, 그리고 공간 미학의 변화
전통적인 조적조 건물들 사이의 골목을 유리 천장으로 덮어 만든 파사주는 그 상점의 입면 역시 조적조인 탓에 각각의 쇼윈도가 확보할 수 있는 너비와 깊이에 한계가 있었다. 결국 작게 분절된 여러 개의 상점이 일렬로 배치된 수평 통로가 파사주 쇼핑 공간의 본질이다. 단선적인 동선 구성과 상점 배치로 사람들의 산책은 2차원의 영역에 머물렀다. 그리고 산책자가 감상하는 상점들의 입면은 고색창연한 장식과 신고전주의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첨단 기술의 유리 천장과 어색하게 동거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19세기 중반엔 건물 주요 부분의 구축 방식이 석재 조적조에서 철 구조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많은 건축가는 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건축 미학을 찾고자 노력했다. 프랑스의 건축가 루이-샤를 부알로Louis-Charles Boileau는 르 봉 마르셰의 증축을 진행하며 철 구조 건축 시대의 미학적 관점은 과거 조적조 건축에서 주된 관심사였던 건물의 덩어리mass에서 벗어나 그 덩어리가 감싸고 있는 빈 공간void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제 자체로서의 아름다움보단 건물 속 분위기, 빛과 그림자 등을 통해 발현되는 공간의 아름다움이 중요해진 것이다. 1852년에 개점한 이래 여러 차례의 증축을 거친 르 봉 마르셰 건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루이-샤를 부알로와 귀스타브 에펠Gustave Eiffel이 함께 작업한 아트리움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기념비적 형태의 철제 계단이 3개 층에 걸쳐 휘감아 흐르고 그 위로 철제 구조의 넓은 유리 천장을 통해 풍부한 자연광이 유입된다. 높은 층고의 아트리움 공간 이곳저곳에 매달린 샹들리에의 수정 장식은 자연광을 만나 다채로운 빛의 향연을 펼쳤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제의를 웅장하게 경험할 수 있었고, 아트리움의 중앙에 서 있노라면 저 너머 다른 부서의 쇼핑 광경까지 즐길 수 있었으니 이 공간은 진정한 ‘백화점百貨店’의 건축이라 불릴 만했다. 2차원적인 파사주에서 3차원적인 백화점 공간으로의 전환은 기술 발달을 통한 쇼핑 건축의 진일보라 할 수 있다. 르 봉 마르셰의 아트리움은 근현대식 백화점 공간의 원형이 되었다.

1852년 개장한 프랑스 파리의 백화점 ‘르 봉 마르셰’. 3개 층에 걸쳐 설치된
철제 계단과 자연광이 유입되는 유리 천장이
인상적이다.

영국의 리처드 로저스와 이탈리아의 렌초 피아노가 구조 엔지니어링 그룹 오브 애럽 앤드 파트너스와 협업해 설계한 퐁피두 센터.

더현대 서울은 대형
상업 공간과 팝업 스토어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만든 대표 사례로 꼽힌다.
리처드 로저스가 설계했다.
자유로운 디스플레이 공간을 위한 기술 혁신
1977년 1월 31일, 파리의 보부르 지역에 미술관 겸 복합 문화 공간인 퐁피두 센터가 개장했다. 당시 30대의 젊은 건축가였던 영국의 리처드 로저스와 이탈리아의 렌초 피아노는 세계적인 구조 엔지니어링 그룹인 오브 애럽 앤드 파트너스Ove Arup & Partners와의 협업으로 엑소스켈레톤Exoskeleton 구조 공법을 통해 완벽한 무주 공간을 디자인했다. 내부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할 구조체들이 건물 바깥으로 자리를 옮긴 덕에 유연하고도 자유로운 전시와 행사 기획이 가능한 거대한 무주 공간이 완성되었다. 건물의 외관이 독특하고 복잡한 철 구조체들로 감싸져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퐁피두 센터의 획기적인 외관만큼이나 획기적인 공간 운용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물건을 디스플레이하고 이용자의 동선을 구성한다는 점은 미술관과 쇼핑몰이 공유하는 공간의 본질이다. 리처드 로저스는 전시와 행사 공간 디자인에서 그러했듯이 쇼핑 공간의 개념도 재정립하고자 했다. 그는 퐁피두 센터를 설계한 지 30년 만에 오브 애럽 앤드 파트너스와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다시 한번 기둥 없는 대공간에 관한 실험에 착수했다. 이번엔 쇼핑몰인 ‘더현대 서울’이었다. 더현대 서울은 대형 상업 공간과 팝업 스토어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만든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이 팝업 스토어의 중심지가 되는 데엔 팝업 브랜드들이 집중적으로 모일 수 있는 지하 2층의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도 한몫했지만, 그 화룡점정은 역시 지상 5층의 거대한 무주 공간이다. ‘빨간 크레인’이라 불리는 8개의 구조체가 건물의 외부에서 철제 케이블을 아래로 당김으로써 50×135m의 유리 천장 프레임을 띄우고 무주 공간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이 유리 천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연광 아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대한 팝업 스토어의 자유로운 연출과 각기 다른 층에 구성된 실내 조경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수많은 방문객을 사로잡았다. 짧은 기간 동안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팝업 스토어의 이미지는 21세기의 소비 패턴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환상이라 할 수 있다. 철 구조물의 발달은 파사주 쇼윈도에 비친 환상을 도시 속 블록 스케일의 환상으로 증폭시켰다. 더현대 서울은 ‘장엄한 환상Spectacular Phantasmagoria’의 시대에 걸맞은 장엄한 건축이 되었다. 한편, 파리 몽테뉴 30번가의 입면 디자인을 차용해 만든 ‘디올 성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브랜드의 콘셉트를 경험케 하고 사라지는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구축되었다. 게다가 석재와 같은 원본 건물의 외장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유리와 메탈 메시를 이용해 기존의 건축 어휘와 재료 간의 전통적인 정합성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덕분에 서울 한복판에 도시적 맥락 없이 파리의 건축물을 모사했다는 식의 건축적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현재의 디올 성수가 팝업 스토어에서 상설 매장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결국 이곳은 건축이라기보단 하나의 이벤트 혹은 환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4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1500m2 규모의 팝업 스토어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고,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브랜드의 환상 경험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찾는 새로운 의미 구성 행위가 되었다. 소비자와 VMD 전문가들은 쇼핑의 공간을 판매를 위한 매개체가 아닌 라이프스타일을 만나는 장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은 건축 기술과 만나 지금도 변화 중이다.
WRITER 이진규(건축가, 머릿돌에이스 공동대표)
Related articles